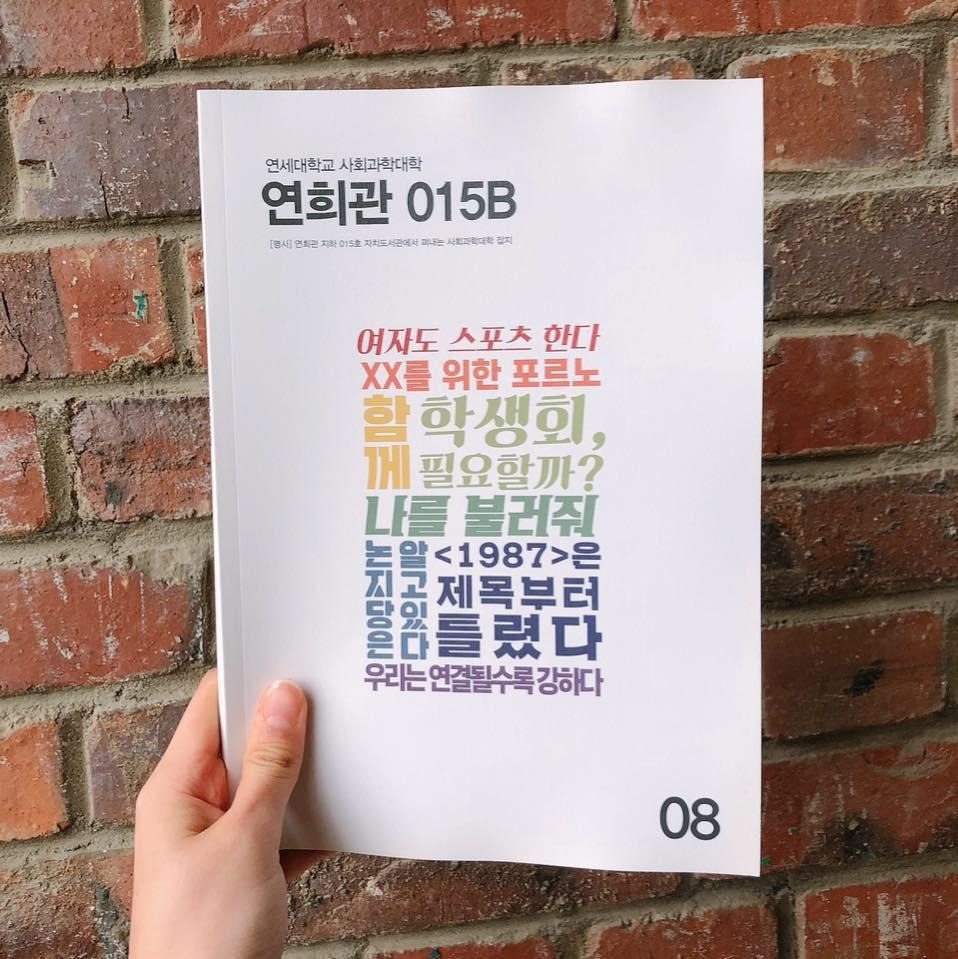티스토리 뷰
졸업을 하루 앞둔 목요일, 화창한 오후였다. 과사무실에서 학사모와 가운을 빌리고는 잠시 연희관 앞의 환풍구 위에 걸터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. 볼이 빨간 두 여자아이들이 다가와 말을 건넸다. 그녀들은 대안학교 학생들이며 선생과 함께 캠퍼스를 방문하였다고 밝혔다. 선생은 아이들에게 재학생들과 인터뷰를 해올 것을 요청했고, 그 아이들은 내게 인터뷰를 요청했다. 먼지와 소음으로 휩싸인 한적한 캠퍼스에서 한가해 보였던 나는 그들에게 꽤 반가운 인터뷰이였는지, 그녀들과 같은 이름표를 목에 건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. 진지한 그들의 태도는 나로 하여금 담배를 끄고 고쳐 앉게 했다. 그들이 들고 있던 질문지에는 긴 답변이 필요한 짧은 문항들이 적혀있었다. 전공, 전공을 통해 얻은 점들, 생각을 바꾸게 된 사건들 등등 내가 고민하고 사유해왔던 폭넓은 사태를 그들이 이해할 수 있을 언어로 전환해 전달하고 있었다. 열심히 무언가를 적던 한 아이가 나를 당황케 하는 물음을 던졌다.
마지막으로 저희 같은 학생들에게 해 줄 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?
망설였다. 내가 가진 인생관을 그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타당할까. 어쩌면 또 다른 성격의 폭력을 가하는 것일지도 모르기에 좀처럼 입을 뗄 수 없었다. 하지만 답변을 기피할 수도 없었다. 분명 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견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.
경주마가 되지 말 것
침묵을 깨고 답변했다. 이 세계는 다양한 생각과 시각에서 비롯된 저마다의 가치들이 모두 화폐라는 단일한 가치로 환원될 수 있고, 이제 더 이상 가치들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화폐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관심만 남겨졌다. 그리고 그 방법들도 구체적인 수준까지 친절하게 결정되어 있다. 명확한 경주로가 놓인 셈이다. 이제 우리는 그 경주로만을 바라보도록 시야가 고정된 채, 양옆의 경주마들보다 빠르게 달려야 하는 숙명이다. 나는 천진난만한 아이들에게 이러한 비극의 쇠창살로부터 자유로울 것을 주문했다.
고개를 끄덕이던 어린 탐방가들은 인사를 건넨 뒤 내가 가리킨 신촌의 맛집으로 떠났다. 그들은 떠났지만 나는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다. 그들에게 던졌던 진술의 참을 수 없는 유약함 때문이었다. ‘하지만 그런 경주마들이 결국 이 세계를 만들어 온 것 아닌가요?’, ‘대학입시라는 경주로에서 훌륭한 경주마였던 당신은 당신의 언명으로부터 독립될 수 있나요?’, ‘경주로부터의 탈피가 경주를 해체하지 못하는 한, 결국 경주를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이들이 설정한 ’경주능력‘이라는 척도에 의해 루저로 낙인찍힐 뿐일 텐데요’, ‘고정된 경주로를 벗어나더라도 아무도 뛰지 않은 순수한 독자적 경로를 찾을 수 있나요?’와 같은 반론들이 귀에 맴도는 듯했다.
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엄격한 침묵 대신 소박한 내뱉음을 던질 용기가 문득 필요했던 걸까? 내가 앉아있던 연희관 환풍구의 높이만큼 그들보다 더 높은 위치감을 느꼈던 걸까? ‘어린 시절로 돌아간다면’의 공상들이 뇌리에 새겨둔 답안을 입 밖으로 꺼내고 싶었던 걸까? 몇 개비의 담배를 더 태우는 동안 생각을 정리했다. 그들에게 있어 나는 인생 컨설턴트들이 도처에 널려있는 시대에 조금 특별한 척하려는 어설픈 또 하나의 컨설턴트였을 뿐이다. 차안대를 벗는다면 청각과 후각, 촉각, 미각 등의 다른 감각들이 민감해질 것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. 그들이 쓰고 있거나 곧 쓰게 될 것이라고 단정해버린 것이다. 나보다도 더 민감할 이들에게.
그들과의 짧은 인터뷰는 어쩌면 그들보다 내게 더 많은 깨달음을 던져주었으리라. 마치 어느 초월적 존재가 어떤 의도를 갖고 내게 보낸 것처럼 짧고 강렬한 여운을 남겼다. 무슨 말을 해야 했을지는 여전히 수수께끼다. 단지 한 마디를 덧붙이지 못한 점이 너무나 아쉽다. “그 답을 여전히 나도 찾고 있다”고.
글 오뎅(기고)
'서사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[서사] 자소서를 잘 쓰는 팁 (0) | 2017.01.25 |
|---|---|
| [안] 이제 셀리그먼의 개를 풀어주자 (1) | 2017.01.23 |
| [소설] 고양이에게 말을 건다 (0) | 2017.01.18 |
| [서사] 사회과학대 1학년생의 다짐 (0) | 2017.01.13 |
| [서사] #와카모노 #인턴의 #뉴미디어부 #관찰일기 (0) | 2017.01.08 |
- Total
- Today
- Yesterday
- 총여학생회
- 공일오비3호
- 공일오비4호
- 사회과학교지
- 공일오비13호
- 몸
- 영화비평
- 도시
- 홈리스
- 여행
- 10호특집
- 책방
- 공일오비
- 연세대학교
- 공일오비9호
- 윤희에게
- 코비컴퍼니
- 공일오비11호
- 페미니즘
- 연희관공일오비
- 공일오비12호
- 죄많은소녀
- 공일오비7호
- 공일오비8호
- 퀴어
- 너 화장 외(않)헤?
- 공일오비6호
- 공일오비10호
- 연희관015B
- 신촌
| 일 | 월 | 화 | 수 | 목 | 금 | 토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 | 2 | 3 | 4 | |||
| 5 | 6 | 7 | 8 | 9 | 10 | 11 |
| 12 | 13 | 14 | 15 | 16 | 17 | 18 |
| 19 | 20 | 21 | 22 | 23 | 24 | 25 |
| 26 | 27 | 28 | 29 | 30 | 31 |